I. 서 론
대류권 산란(Troposcatter, tropospheric scatter) 통신은 대기의 대류권 층에서 전파가 산란되는 현상을 이용하여 수백 km까지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초가시선(BLoS, beyond-line-of-sight) 통신 기술이다. 대류권 산란 현상의 물리적 원리는 대류권 내 공기의 불규칙성에 있다. 대류권의 공기는 온도, 압력, 습도의 불균일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터뷸런스(turbulence)를 형성한다. 이로 인해 송신 안테나에서 출발한 고출력 전파가 대류권을 만나면 에너지가 여러 방향으로 산란된다. 이 중 일부 에너지가 수신 안테나 방향으로 산란되면서 통신이 이루어지는 원리이다. 즉, 송신기와 수신기 안테나가 모두 바라보는 상공의 특정 공간인 ‘공통 체적(common volume)’을 통해 통신이 이루어진다.
이 기술은 주로 군용 장거리 통신이나 해상 통신 등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환경에서 안정적인 통신망을 제공하는 데 활용되었다. 1970년대에 위성 통신이 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로 손실과 낮은 데이터 전송률로 인해 활용도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최근 고출력 증폭기, 고감도 수신기, 첨단 신호 처리 기술 및 MIMO(multipleinput multiple-output)와 같은 안테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류권 산란 통신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위성 통신이 재밍(jamming)에 취약한 반면, 대류권 산란 통신은 이러한 환경에서 통신망의 생존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어 중요한 기술로 재평가되고 있다.
장거리 통신을 위한 시스템 설계를 위해서는 경로 손실을 정밀하게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부문(ITU-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radiocommunication sector)은 이를 위해 다양한 장거리 전파 예측 모델을 권고하고 있으며, 대류권 산란 손실 예측 모델은 대표적으로 P.617 모델[1]과 P.2001 모델[2]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대류권 산란 통신 기술의 재조명과 함께 채널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류권 산란 관련 연구는 실제 측정 장비를 동원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ITU-R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거나[3], 추가적인 손실을 고려하여 더 정교한 모델을 제안한다[4]. MIMO 기술을 대류권 산란 링크에 적용하여 이론적인 대류권 산란 통신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5]도 있으며, 기존의 경험적 채널 모델과 달리 파라볼릭 방정식(PE, parabolic equation) 모델을 사용하여 대류권 산란 전파 환경을 더욱 정밀하게 구현하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6].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대류권 산란 손실량 예측을 위하여 정교한 채널 모델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복잡한 산악 지형과 뚜렷한 사계절 기후 변화 등 고유한 전파 환경을 가진 국내 환경에서 대류권 산란 통신 채널 모델에 대한 연구나 실측 데이터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7],[8]. 따라서, 국내 환경에 적합한 대류권 산란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ITU-R 권고 모델들이 국내 환경에서 어떠한 결과를 보이며,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일지에 대한 비교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ITU-R 국제 권고서인 P.2001-4와 P.617-5의 대류권 산란 전송 손실 모델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국내 환경에서 두 모델 중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해본다. P.2001-4 모델은 일반적인 장거리 전파 손실 예측을 위한 모델이고, 대류권 산란 뿐만 아니라 회절, 덕팅, 전리층 반사 등의 손실량 예측 모델까지 포함하는 범용적 모델이다. P.617-4는 장거리 중계기 시스템을 가정하는 모델이다. 이처럼 P.2001-4 모델과 P.617-5 모델은 사용 목적이 다르고, 권고하는 대류권 산란 모델에도 꽤 차이가 있으므로 국내 환경에서 장거리 대류권 산란 경로손실 예측을 위해서는 둘 중에서 어느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판단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P.617-5 모델이 일부 환경에서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에 특히 주목하여 분석 결과를 보이고자 한다. 본래 채널 모델링을 위해서는 충분한 측정 데이터가 필요하나, 국내에 관련 연구나 확보된 측정 데이터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MATLAB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국제 권고 모델에 국내의 환경을 적용, 결과를 예측해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II절에서는 ITU-R에서 권고하는 두 가지 모델의 차이점에 대하여 분석해본다. III절에서는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IV절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한다. V절에서는 결론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II. ITU-R P.617과 P.2001 모델 간 비교
본 논문에서는 ITU-R에서 제공하는 장거리 전파 모델인 P.2001, P.617 두 가지 권고서의 대류권 산란 모델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다. ITU-R P.2001 권고서는 ‘A general purpose wide-range terrestrial propagation model in the frequency range 30 MHz to 50 GHz’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거리 전파 모델이다. 또한, 경로 감쇠 수식들을 독립적인 서브 모델을 통해 모듈화했기 때문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등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좀 더 적합하게 모델링이 되었다. ITU-R P.617 권고서는 ‘Propagation prediction techniques and data required for the design of trans-horizon radio-relay systems’로 지평선 너머로의 장거리 중계기 시스템을 위한 예측 모델이다. 두 모델들은 몇 번의 개정을 거쳐 최신 모델인 P.2001-5[2]와 P.617-5[1]까지 업데이트되었다. 그런데 대류권 산란 모델만 고려할 때, 가장 최신 버전인 P.2001-5에서는 P.617-5의 대류권 산란 모델과 완전히 동일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점은 P.617-5의 대류권 산란 모델의 한계점이다. ITU-R 홈페이지에서는 P.617-5의 대류권 산란 모델이 거리 66 km 이상, 산란각이 2.6 mrad (약 0.149 도) 초과인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검증 결과에 따르면 짧은 거리와 작은 산란각에서는 P.617-5의 대류권 산란 모델이 상당한 오차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구 버전인 P.2001-4 모델[9]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에 주목한다. 최신 P.617-5(이하 P.617) 모델과 구 버전인 P.2001-4(이하 P.2001) 모델을 MATLAB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P.617에서 권고하는 대류권 산란 전송 손실 LTropo,P.617은,
N0는 연 평균 해수면 표면 굴절률, dN은 대기 최하층 1 km까지의 연 평균 굴절률 감소율, hs은 지형의 해발고도, hb는 기후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높이 척도이며 국제 평균은 7.35 km이다. 본 논문에서는 7.35 km 값을 대입하였다. 또, f는 주파수(MHz), d는 경로 거리(km)이다. θ는 산란 각도(mrad), Gt와 Gr는 송신 안테나 이득(dBi), 수신 안테나 이득(dBi), Yp는 시간율(time percentage)에 의한 손실량을 말한다.
P.617에서 권고하는 대류권 산란 모델은 참고문헌 [3]에서 제시된 모델을 인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3]에서는 ITU-R에서 권고하는 구 버전의 장거리 전파 모델인 P.2001-1, P.452-13, P.617-3의 대류권 산란 모델을 통합한 모델을 제시했다. 대류권 산란 모델을 주파수, 산란각, 거리, 안테나이득, 시간율에 의한 함수로 정의한 뒤에 genetic algorithm optimization을 이용하여 계수 값을 최적화하여 하나의 수식을 도출했다. 여기서 최적화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들이 거리는 최소 66 km 이상, 산란각은 최소 2.6 mrad 이상이므로 P.617-5 모델의 한계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P.2001에서 권고하는 대류권 산란 전송 손실 LTropo,P.2001은,
M은 기상학적 파라미터이며, LN은 common volume의 높이에 따른 손실량이고, r는 기후 구역에 따른 파라미터, ae는 유효 지구 반지름 값으로 약 8,500 km이며, f는 주파수(GHz)이고 다른 파라미터는 P.617의 모델과 동일하다.
P.617의 모델과 P.2001의 모델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유사한 수식을 가지지만, P.2001 모델에서는 common volume의 위치에 따른 손실량 파라미터인 LN이 추가되어 있다. 즉, 거리가 멀어지고 산란각이 커진다면 Ldist, P.2001의 값도 점점 더 커질 것이다. 특히, 산란각이 매우 커지면 4.34의 기울기를 가지는 htrop로 인한 손실량도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III. 시뮬레이션 방법
본 연구에서는 MATLAB을 사용하여 P.617과 P.2001 모델의 경로 손실을 시뮬레이션한다. 두 모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는 완전한 평지 환경을 가정하여 거리에 따른 대류권 산란 손실량 예측을 수행하고 두 번째로는 국내의 주요 도시 사이의 지형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주파수에 따른 대류권 산란 손실량의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을 예측해보도록 한다.
두 모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지형 고도를 1 m로 설정한 완전 평지 환경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송수신 안테나 고도는 20 m로 설정하고, 거리를 30 km에서 300 km까지 변화시키며 경로 손실을 계산했다. 또한, 굴절률과 같은 기상 파라미터를 얻기 위해, 송수신 지점은 서울-부산 사이의 직선 경로상에 위치한다고 가정하고 P.2001의 관련 테이블을 이용하였다. 송수신 지점 사이의 common volume의 위도/경도 값에 따라 P.2001에서 제공하는 테이블에서 굴절률 값을 얻어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다. 그림 1은 평지 환경을 MATLAB으로 구현하여, 지형과 송수신 각도, common volume의 위치를 시각화한 그림이다. 가로축은 거리, 세로축은 고도를 나타내며, 검은 선이 지형(1 m 높이의 완전 평지), 녹색 점선은 높이 0 m의 지면을 표현하는 기준선, 빨간 원은 TX의 위치, 빨간 점선은 TX 안테나 빔의 방향을 나타내며, 파란 원과 점선도 같은 방식으로 RX를 표현한다. 초록색 원은 common volume의 위치를 나타낸다. Common volume의 위치는 송수신 안테나 각도를 직선으로 표현하였을 때 교차하는 지점으로 가정하였으며, 송수신 각도는 지형에 가로막히지 않는 최소의 각도로 가정하되, 현재처럼 완전 평지일 경우는 0.01°로 임의로 설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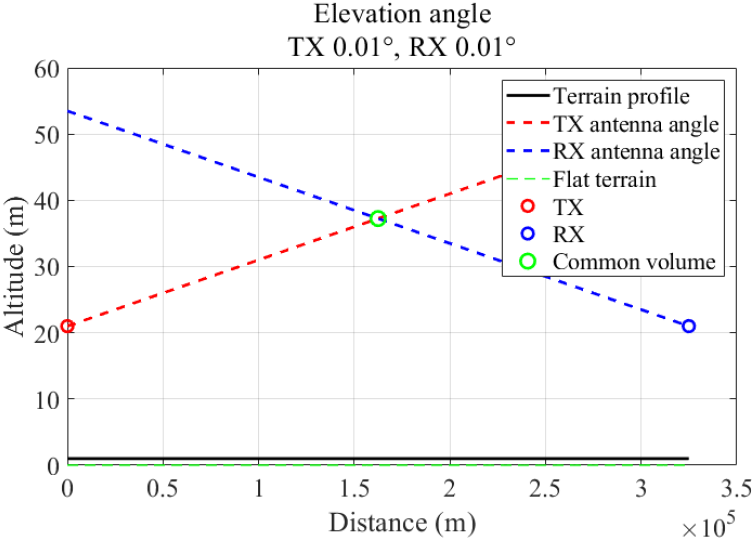
두 번째로, 국내의 환경에서 대류권 산란 통신의 경로 손실을 예측하기 위해, 서울을 송신점으로 대표적인 단거리(평택), 중거리(대전), 장거리(부산) 경로 3가지를 선정했다. 각 경로의 좌표와 거리는 표 1과 같다. 지형 데이터는 MATLAB Mapping Toolbox의 elevation 함수로 출력한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두 모델의 대류권 산란 손실량의 CDF를 출력하여 결과를 비교했다. 그림 2~그림 4는 각각 서울-평택, 서울-대전, 서울-부산의 지형 프로파일과 송수신 각도, common volume의 위치를 시각화한 그림이다. 그림 2~그림 4에서 송수신 각도는 지형에 가로막히지 않는 최소 각도를 찾는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즉, 송신 각도는 모든 지형 프로파일의 높이 값과 송신지점이 이루는 각도 중에서 최댓값을 선택하였으며, 수신 각도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 Location | Latitude, longitude | Distance from Seoul (km) |
|---|---|---|
| Seoul | (37.56, 126.97) | - |
| Pyeongtaek | (36.99, 127.10) | 65 |
| Daejeon | (36.35, 127.38) | 140 |
| Busan | (35.18, 129.07) | 3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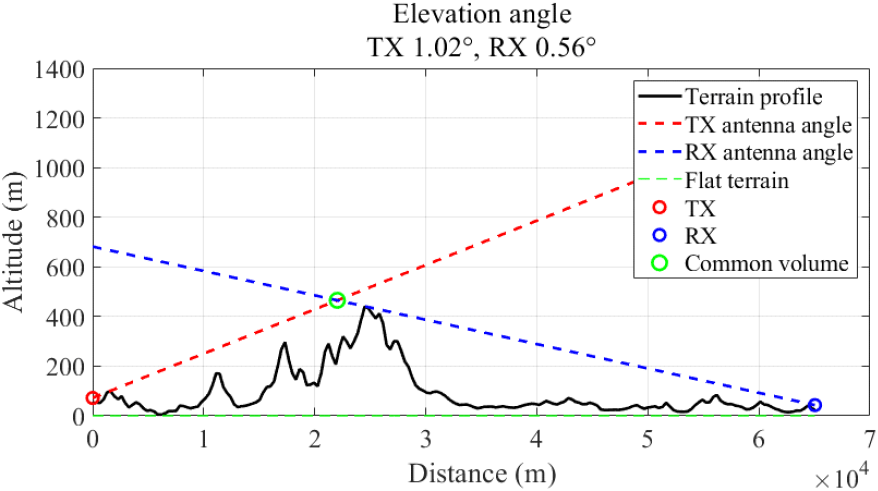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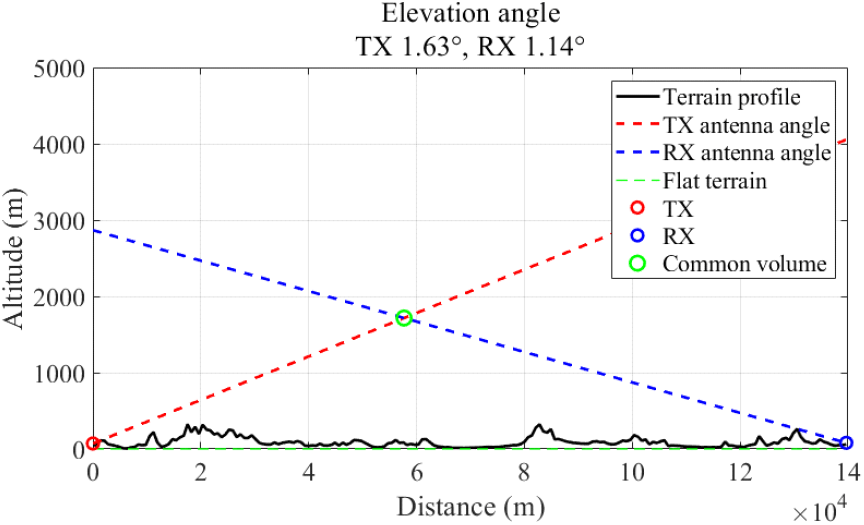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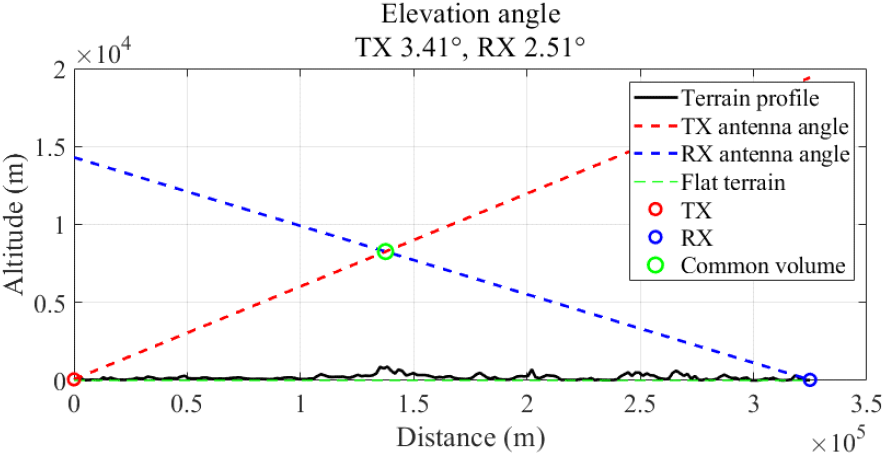
IV.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5는 완전한 평지 환경에서 거리와 시간율에 따른 대류권 산란 손실량을 출력한 그림이다. 시뮬레이션 주파수는 2GHz로 설정했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거리, 세로축은 대류권 산란 손실을 나타낸다. 세모 마커가 있는 빨간색 선은 P.2001, 원 마커가 있는 파란색 선은 P.617 모델의 결과이며, 각 모델의 결과는 10 %, 50 %, 90 %의 시간율에 따라 표기했다. 시간율이 50 %일 때를 기준으로 보면 거리가 약 70~80 km 이하로 짧을 때는 P.2001의 값이 최대 10 dB 정도로 크게 나타나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P.617의 값이 약 2 dB 정도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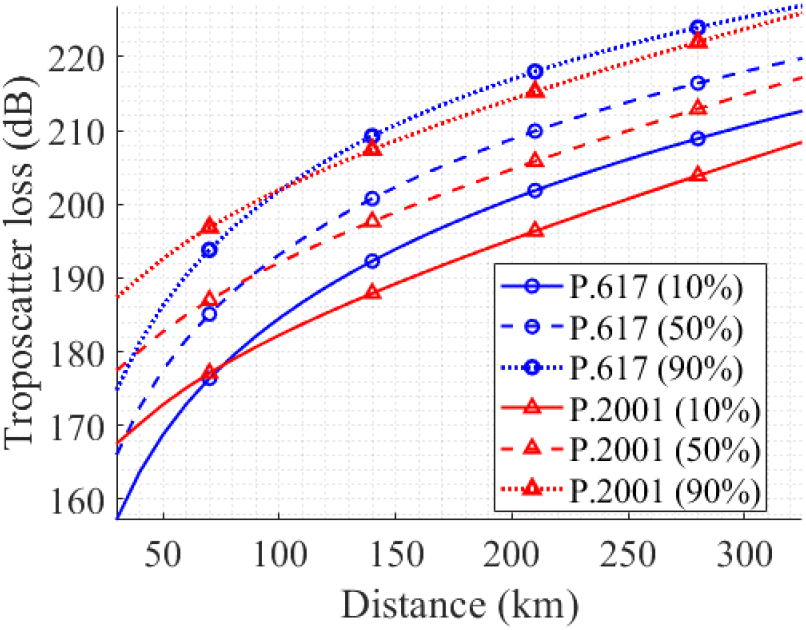
거리가 멀어질 때는 P.617과 P.2001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최대 4 dB 정도의 일정한 차이를 가지지만, 짧은 거리에서 P.617 모델은 P.2001보다 손실을 10 dB 이상 낮게 예측하는데, 이것이 ITU-R이 언급한 오차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했던 P.617의 최적화 과정에서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로 인한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2.6 mrad(약 0.149도)라는 산란각이다. P.617과 P.2001 모두 산란각을 계산할 때 지구의 굴곡을 고려한다. 완전 평지 환경에 송수신 안테나 각도가 0도라고 가정하더라도 산란각이 0.149도가 되려면 송수신거리가 22 km 이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대류권 산란 통신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거리이고, 장애물도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P.617 모델의 오차 발생 조건(산란각 2.6 mrad 이하)은 실제 통신 환경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다. 완전 평지에서 대류권 산란 통신의 송수신거리가 22 km 이하로 아주 짧은 조건에서는 P.617의 예측값이 오차를 10 dB 이상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완전 평지 조건이라 하더라도 거리가 약 70~80 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P.617과 P.2001의 예측값이 큰 차이를 가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지형 환경이 산악 지형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P.617 모델의 단거리/저산란각 한계는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그림 8는 서울에서 평택, 대전, 부산까지의 지형 프로파일을 적용하여 주파수에 따른 P.617과 P.2001 모델의 예측 결과 CDF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대류권 산란 손실량, 세로축은 시간율(Tpc, time percentage)을 나타낸다. 세모 마커가 있는 빨간색 선은 P.2001, 원 마커가 있는 파란색 선은 P.617 모델의 결과이며, 700 MHz, 2 GHz, 4.7 GHz의 세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결과를 각각 표기했다. 모든 환경에서 주파수 대역이 높아질수록 경로손실이 커지며, P.2001의 경로손실 예측값이 P.617의 예측값보다 크게 나타난다. 또한, 송수신거리가 먼 환경일수록 P.2001 예측값과 P.617 예측값의 차이가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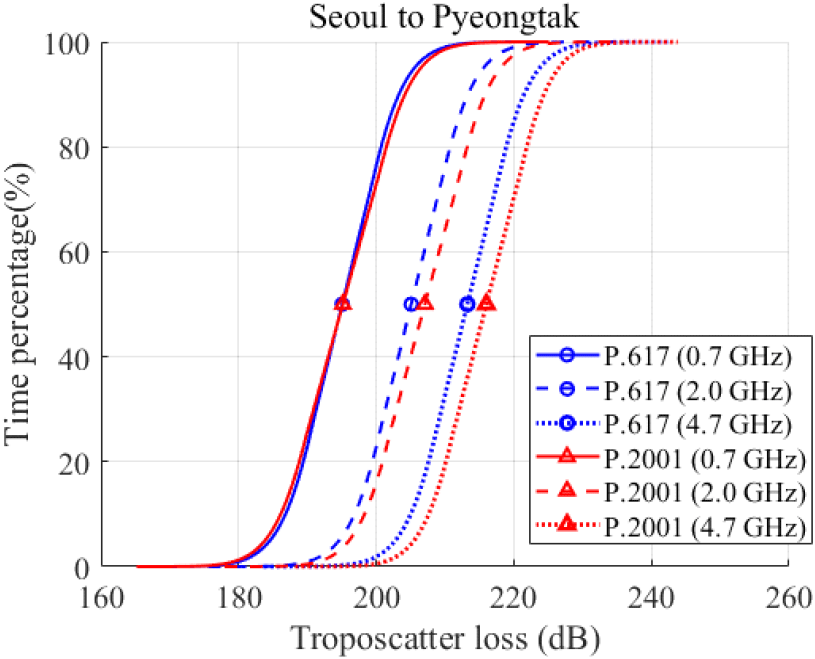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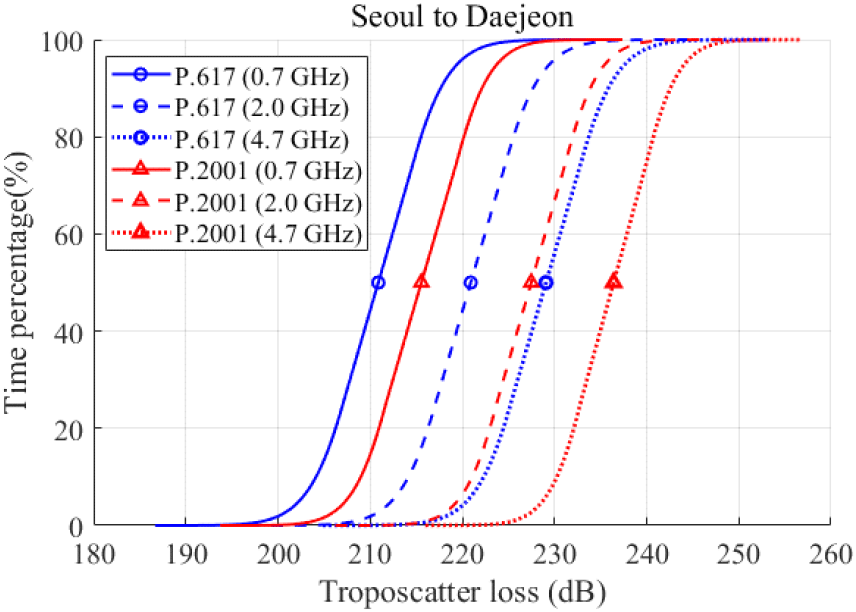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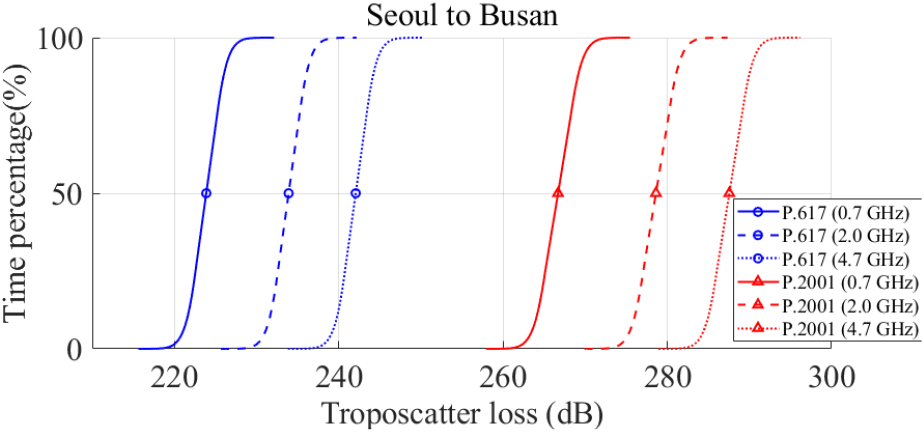
서울-평택 경로에서는 P.2001과 P.617의 결과가 약 3 dB(4.7 GHz의 경우) 차이가 나지만, 서울-부산 경로에서는 약 45 dB(4.7 GHz의 경우)까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차이가 커지는 것은 앞서 수식 비교에서 언급하였듯이, P.2001의 모델이 산란각에 의한 손실량을 P.617 모델보다 크게 고려하기 때문이며, 서울-부산의 지형으로 인한 송수신 안테나 각도의 증가와 지구 곡면에 의한 산란각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만약, 국내 환경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할 때, 서울-부산의 경우처럼 P.2001과 P.617 모델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P.617 모델의 결과를 신뢰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이유는 P.617 모델이 참고문헌 [3]에서 P.2001-1(본 연구의 P.2001-4와 동일)을 기반으로, 전 세계 실측 데이터를 사용해 최적화한 모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2 km 이하의 짧은 거리의 평지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가 아니라면, P.617의 예측값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대류권 산란 통신의 최소 수신 신호 세기를 일반적 GPS 수신 감도인 −160~−130 dBm, 송신 신호 세기는 60 dBm으로 가정하면[10], 대류권 산란으로 인한 손실 한계는 약 190~220 dB로 가정할 수 있다. P.617의 결과를 보았을 때, 이 조건에서는 서울에서 평택 정도의 거리까지는 700 MHz~4.7 GHz의 주파수 대역 사용이 가능하고,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700 MHz~2 GHz 대역 사용이 가능하며,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700 MHz에서도 불가능하므로 더 민감한 수신기를 사용하거나 더 낮은 주파수 대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TU-R P.617과 P.2001의 대류권 산란 손실 모델을 국내 통신 환경의 활용도 측면에서 비교 분석했다. 특히, ITU-R에서 경고하는 P.617의 한계점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장애물이 없는 완전한 평지 지형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약 70~80 km 이하의 환경에서는 P.617이 손실을 최대 10 dB까지 낮게 예측하는 오차를 보임을 확인했다. 송수신 거리 66 km 이하, 산란각 2.6 mrad 이하에서 오차를 보이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산란각이 2.6 mrad 이하라는 조건은 완전 평지에서 송수신 거리가 22 km 이하에서 성립하는데 이는 대류권 산란 통신에서는 너무 짧고 비현실적인 조건으로 판단된다.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국내에서의 활용도를 고려하였을 때, P.617의 한계점은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국내 실제 지형(서울-부산, 서울-대전, 서울-평택)을 적용한 분석에서 P.2001 모델은 P.617 대비 장거리로 갈수록 더 높은 손실을 예측했다. 이는 지형과 송수신 거리로 인한 산란각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다만, P.617 모델이 전 세계 실측 데이터 기반의 최적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모델 간 예측치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국내 장거리 환경에서는 P.617의 결과가 실제 현상에 더 근접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국내 환경에서 대류권 산란 손실량 예측을 위해서는 P.617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P.2001 모델과 P.617 모델은 사용 목적이 다르고 적용 주파수 범위 등 적용 조건의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P.2001 모델은 다양한 장거리 전파 현상을 고려하고 있어 매우 상세하며 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류권 산란 손실 예측이 주 목적이라면 P.617 모델이 효율적이지만, 회절이나 덕팅 등 다양한 전파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P.2001 모델이 더 적합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국제 권고 모델만을 이용하여 국내 환경의 대류권 산란 손실량을 예측하였지만, 실제로 국내에 적합한 대류권 산란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링을 해야 한다. 향후 국내 특정 경로에서의 실측 데이터를 확보하여 본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국내 환경에 특화된 더욱 신뢰도 높은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